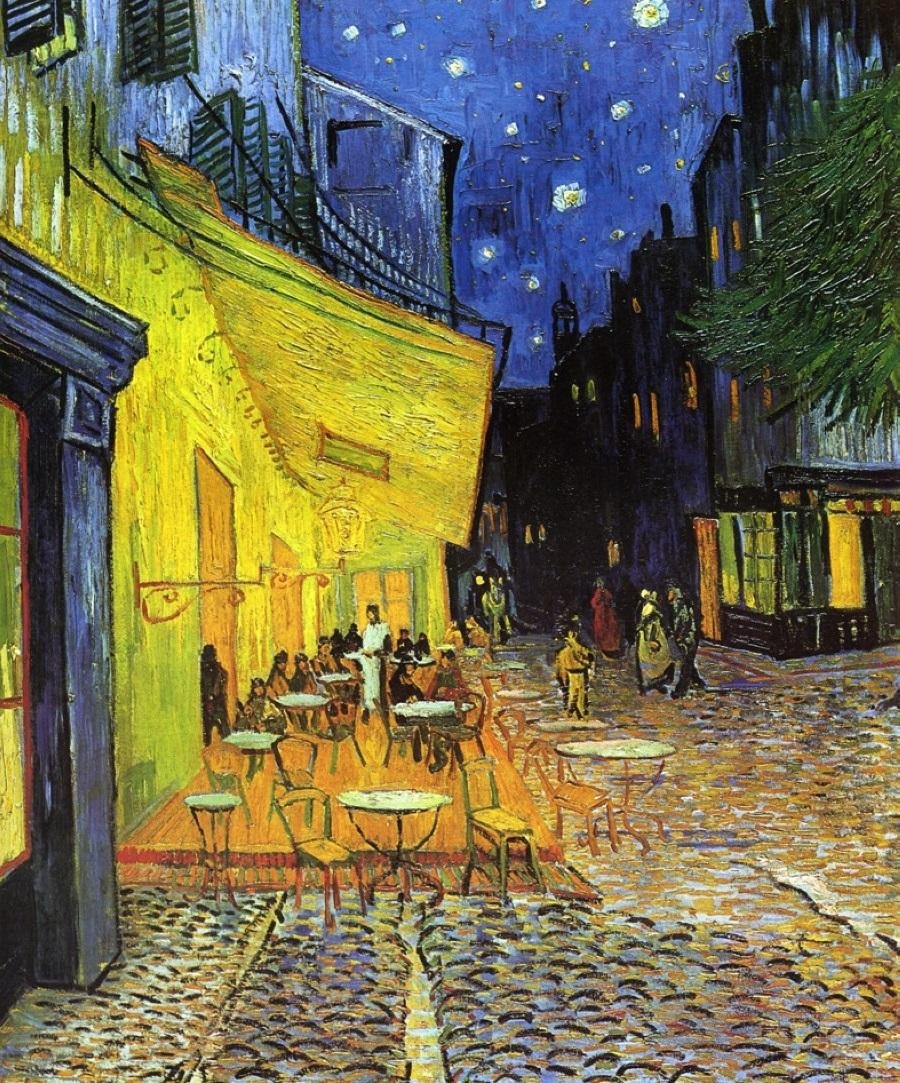신경정신약물학 Ch21~26
) -->
Ch21. 공황장애
이 병과 우울증 덕분에 정신과에 대한 stigma 문턱이 낮아졌다.
연예인이나 일반인들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.
) -->
-agoraphobia 에서만 panic attack 이 specifier 로 들어감.
-panic disorder 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.
) -->
first line Tx: SSRI , SN RI
) -->
SSRI: SSRI 가 만약에 induced-indifference 유발하면, 감정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다. anxiety disorder에서 SSRI를 가장 먼저 recommend 하는 이유가 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기전이 될 수도 있다.
) -->
anxiety disorder 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서 hyperarousal 되는 거다. anxiety tone 이 올라가고, 불안이 올라가는 것
-> SSRI 가 indifference를 유발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닐까?
) -->
약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
->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고, 약을 어떻게 주면 될까?
: 기본적으로 SSRI 제제 중에 하나를 시작하면서 +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1~2주 정도는 BDZ 계열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음.
-> 입원 환자면 1~2주 내로 증량 후 tapering out 이 가능한데, 외래에선 4주 이내에 BDZ를 끊어 주는 게 좋다. [실제로는 anxiety tone 이 높아서, 1달 이내에 끊기 어려울 수 있다.]
-> alprazolam 이 좋다. [anxiety disorder 에선 추천되는 BDZ다.]
: alprazolam 은 다른 BDZ에 비해 sedation 이 덜 된다.
: 임상적으로 저녁에 수면 목적 같은데 저녁에 alprazolam 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으면, 이 약이 왜 사용되는지 고민해 봐야 하고, 저녁 시간 약은 빼주는 것도 좋다. [alprazolam 0.25mg를 저녁에 먹고, 잘 잔다면? 빼주는 것도 좋다.]
-> 초반에는 alprazolam 1T tid 로 주는 게 중요하다. 지속이 잘 안 되는 약이기 때문이다. anxiety tone 높고, 불안감 심하면 tid로 주는 게 좋다. dependence 가 걱정되어 소극적으로 쓰면 환자가 알아서 여러 봉지 약을 먹어 버릴 수도 있다.
) -->
[불안 장애 환자 군]
[1]치료할 때 장점이자, 단점은 anxiety tone 이 높아서 agitation 이 심하다 -> 이걸 치료자에게 projection 하면서 irritable 한 경우가 많다.
[2] 본인이 불안하니까 약을 안 먹을 확률은 적다. 대신 약을 여러 봉지 먹는 방식으로 순응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.
[3] 외래에서 약 줄여 보자고 하면 줄이겠다고 하고 나갔는데 5분 뒤에 다시 들어와서 약을 다시 높여 달라고 말하는 환자도 많다.
-> BDZ dependence 가 심하게 오는 환자군이다. 초반부터 BDZ는 치료제가 아니고, 임시로 쓰는 약임을 강하게 교육시켜 놔야 한다. SSRI 제제가 진정한 치료제고, BDZ는 그 때까지 버티게 해 주는 약임을 알려 주기
-> progress note 의 plan 부분에 적어 놔서, 다음 치료자가 f/u을 할 때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좋다.
) -->
-hyperventilation 환자 : 봉지 호흡법, 봉지가 없으면 손으로 막고 CO2 넣어주는 호흡법
: O2 가 덜 들어오게 하고 CO2를 잘 넣어주는 원리만 기억하면 된다.
) -->
-progressive muscle relaxation 기법
: 요가, 필라테스와 비슷한 느낌.
: anxiety tone 이 올라가면 몸이 경직되어 있다. ->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을 교육시켜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.
) -->
-anxiety disorder 는 치료 순응도는 좋은 편인 반면에 생각보다 회복이 어렵고, 오래가는 경우도 많다.
-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약물을 써 주는 게 좋다.
-propranolol 등도 도움이 된다. -> palpitation을 줄여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기전일 것으로 추정된다. anxiety disorder 환자들은 palpitation 자체를 anxiety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
) -->
Ch22. 사회 공포증
치료: SSRI 제제 사용, propranolol 도 많이 사용함
) -->
Ch23. 범불안장애
SSRI 중에서 paroxetine 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건, paroxetine 이 SSRI 중에선 TCA에 가장 가깝고, 상당한 sedation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. BDZ adding 효과를 부가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봐도 된다.
-> BDZ에 비해서 overdose 에 대한 두려움은 덜 하다.
) -->
pregabalin: 유럽에선 first-line treatment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함
-> 신경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) -->
Ch24. 강박장애
-> OC Sx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이 올라온다 해서 예전에는 불안 장애로 분류했었는데, 이젠 GAD, panic attack 들은 확실히 비슷한 교집합이 많으나 OC 는 약간 psychotic disorder 로 보일 정도로 환자의 인지적 오류가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.
-> SSRI 가 TOC.
-> antipsychotics 도 제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. [serotonin 관련 기전이 주되므로 atypical antipsychotics을 사용해 볼 수 있다. ]
-> 완전한 psychotic disorder 는 아닌 것 같다.
-> OC Sx 은 생각보다 잘 낫질 않는다.
-> 약을 줄 때 tolerable 하니 SSRI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, 나중에 보호자들에게 물어 보면 별로 호전되는 이야기를 들어 보기 어렵다고 한다.
) -->
-자신감이 떨어지는 질환이다.
-본인도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. 그러나 주변 가족들은 불편감을 심하게 느낀다. [한번 화장실 들어가면 1시간 씻고 나오고, 자꾸 문 잠그러 간다고 집에 가려고 하고 말이다.]
-PANDAS(pediatric autoimmune neuropsychiatric disorder associated with streptococcal infection), Sydenham's chorea 라는 질환과의 연관성 : 임상에선 별 의미 없으며 시험 등에서는 의미가 있음.
) -->
) -->
Ch25.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
-> 다른 질환들은 nature vs nurture 간의 고민이 많아진다.
-> PTSD 만큼 소인이 명확히 밝혀진 병이 없다. stress 사건으로 인해 누구는 조울증, 누구는 우울증, 누구는 조현병으로 가지만 애매하다. PTSD는 확실한 trauma 가 발병의 원인인 것과 대조적이다.
-> PTSD 는 정신과에서도 굉장히 진단이 (상대적으로) clear 한 질환이다.
) -->
-베트남 전쟁 이후에 참전 군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걸 보고 APA에서 PTSD 라는 진단명을 만들어 냄.
-trauma 의 type을 특정 지을 수가 있다.
: 상대적으로 비교, 연구도 쉽다. // trauma type 중에서는 sexual assault, 그 중에서도 rape 이 가장 높은 prevalence를 보였다 함.
-> rape 도 굉장히 심하겠지만,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쟁통 병사들이 PTSD 가 더 심하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만큼 남성보다 여성이 vulnerable 하고 유병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.
-> stress 에 대한 취약성이 female sex에서 높다.
-> 만약 전쟁에 여성들도 동일하게 참여했다면 trauma type 중에 1등은 war 가 되었을 수도 있다.
) -->
) -->
PTSD 의 clinical triad
: [1] reexperience(재경험) [2] avoidance(회피) [3] hyperarousal(과각성)
-> DSM 5에서는 인지,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추가됨.
) -->
flashback: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다. 과거 회상 씬인데 아름다운 회상씬은 블러링 처리되고, 햇살이 비친다면 끔찍한 기억들은 긴박한 음악이 깔리면서 블러링 되어 있긴 한데, 흑백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떠올리는 영화 장면과 비슷하다
-> 과거의 경험을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.
-> 있는 그대로 회상이 된다기 보다는, 대개 더 안 좋게 왜곡되어 떠오르는 경우도 많다.
->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이들은 기억을 했을 때 더 안 좋게, 더 극적으로 기억을 해 내는 경우도 많다.
->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. 그 때 당시의 감정 상태와 결부되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.
: 뇌 부위 중에는 amygdala, prefrontal cortex 가 중요하다.
[prefrontal cortex 중에서도 DLPFC 중에 VMPFC 중에서 VMPFC가 더 중요하다]
[VMPFC 가 좀 더 emotional 한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]
-DLPFC 는 working memory, 판단력과 더 연관되어 있고 VMPFC는 emotional regulation 과 더 연관이 되어 있다. 그 중에서도 anterior cingulate cortex[ACC]가 특히 emotional regulation 과 연관이 깊다.
-> amygdala 는 과활성되어 있을 것이고, prefrontal cortex 부위는 활성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고, hippocampus의 활성은 저하되어 있을 것이다.
[amygdala 는 공포를 관장하니, 특정 상황에서 과 활성 되어 있을 것이다. emotional regulation 이 저하되어 있을 것이다. 단순히 공포를 느끼는 건 amygdala 가 하는 일이니 과활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느끼는 족족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.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기분 장애 예후도 좋다. 이들은 자신이 당한 불합리한 일들을 rationalization, intellectualization을 잘 한다. 이런 게 우울증 이겨내는 큰 자원이자 힘이 된다. 합리화를 하고, 내가 느끼고 있는 불쾌한 감정을 어떻게든 좋은 감정으로 꾸며내려 하는 게 똑똑한 인간이다. 그래서 화가 나도 그걸 억제하는 게 DLPFC, VMPFC 가 공조해서 PFC 가 감정 조절하고, 충동 조절도 하는 거다. VMPFC 가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 내가 당한 상황에 대해 곧이 곧대로 공포 상황을 받아 들여 버리기도 하고, 오히려 더 왜곡시키곤 한다. 그래서 emotional regulation 이 PTSD 환자들은 떨어져 있다고 보는 거다.]
[hippocampus 도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 주는데, hippocampus에서 하는 일이 그 때 당시 상황에 맞는,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게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 하는데 PTSD 환자들은 그게 잘 안 될 것이다.]
) -->
-PTSD 환자에서 BDZ는 안 쓰는 게 원칙이다.
-> BDZ는 왠만하면 안 쓰는 게 좋다.
-> 다른 anxiety disorder 와 차이점이라면, SSRI 사용은 공통되지만 BDZ는 오히려 행동을 disinhibition 시키는 효과가 있어서, 안 쓰는 게 원칙이다.
-> BDZ 쓸 바에는, mood lability 는 antipsychotics 이나 mood stabilizer를 소량 추가하는 게 더 적절하다.
) -->
-EMDR(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)
: 150만원 주고 2박3일로 가르쳐 주는 학회도 있음.
: 일종의 CBT의 한 기법일 수도 있다.
: 당시 상황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처리를 하는데 emotional regulation 에 distortion 이 있는 게 PTSD 환자들이다 보니,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감정 조절을 돕고, 재처리 하게 해서 flashback 이나 재경험을 줄여주는 치료법이다.
: 기계에서 빨간점을 눈으로 계속 따라오는 방식.
: 억지로 안구운동을 조절해서, emotional regulation을 조절하는 방식.
) -->
-정신분석 기초반 정도는 들어두는 것도 도움이 됨.
: 정신분석학회 정회원 등 자격 요건도 활용 가능.
: 환자의 psychodynamic 이해도 빠를 것이다.
: 미국에서 2억 써서 PT 자격증 얻어 오지 않는 이상, 우리 나라에선 PT 만으로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.
) -->
Ch26. 수면 관련 장애
) -->
-dyssomnia 와 parasomnia 개념
dyssomnia 는 insomnia 가 포함되는 part다.
parasomnia 는 REM sleep 행동 장애 등처럼 수면 자체의 문제보다는 수면 동안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다.
) -->
-수면: 연구해 볼 가치가 큰 영역이다.
-> 추가 수련도 가능하겠으나, 인기가 워낙 많다.
-> 수면다원검사로 인해 profitable 한 측면이 있는 분야다.
-> ISDS2 의 진단 기준을 DSM5 도 많이 참고하며 전자의 권위가 상당히 크다.
) -->
-수면 일지를 쓰는 이유는?
: 인지적 왜곡이 상당히 심한 게 수면장애 환자들이다. -> 분명 옆에서 보면 자고 있었는데, 일어나서 자신은 안 잤다고 표현한다. [옆에서 이름 불러도 안 깰 정도로 잠 들었는데 그 정도도 자는 걸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.]
-> sleep log를 쓰되, 인지적 왜곡이 있는 이들은 sleep log 로도 잘 안 된다.
[자신이 잔 걸로 안 쳐 주면 안 적을 것이다.]
-> 그냥 눕기만 해도 잔 걸로 간주하고 작성하라고 말해 줘야 그나마 활용도가 있을 것이다.
) -->
) -->
-sleep 관련 학회에서는 약어를 많이 사용한다.
: TST(total sleep time) : 이건 별로 안 높은데 TIB가 높은 이들도 많다.
: TIB(Time in bed): 이게 길면 좋지 않을 것이다.
: SE(Sleep efficiency)
) -->
-역기능적 인지와 부적응적 습관 : 이 두 가지가 스필만의 3P model 중 perpetuating factor 다. [만성 불면증으로 만드는 요인이며, 치료의 초점이 되는 부분들이다.]
-> predisposing factor 나 precipitating factor 는 우리가 고쳐주기가 어렵다.
[stress 사건이나 기존의 소인을 우리가 바꾸긴 어렵다]
-> 역기능적 인지: 계속 수면 결손에 대해 걱정을 함, 반추(rumination) 이 심하고, 비현실적인 기대를 지니기도 함(ex) 어제보다 운동을 1시간 더 했으니 9시에 딱 잠들겠죠? 라고 말하는 환자들....)
: anxiety tone 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잠이 안 올 것이다.
-> 부적응적 습관: 밤에 못 잔 잠을 보상하려고 낮에 자려고 한다던지...
) -->
-CBT-I(insomnia)가 따로 파생될 정도로 불면에서 CBT는 중요하다.
-sleep apnea 는 정신과에서도 보고, 호흡기 내과에서도 본다.
-> 치료법: CPAP [전투기 조종사가 쓰는 것처럼 생김]
: 잘 때 이런 걸 쓰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.
: 실제로 obstructive sleep apnea(OSA), central sleep apnea가 있는데 전자는 뚱뚱한 사람에서 호발한다. 혀가 기도를 막아서 airway 가 줄어 들어서 코 고는 거다. (혀가 살이 쪄 있다.) -> CPAP 쓰면 기계로 공기를 우겨 넣는 거다. 혀가 중력을 이기고 말려 올라가면 틈을 봐서 공기를 밀어 넣는거다.
아무리 뚱뚱하더라도 똑바로 누으면 코를 골고, 옆으로 누우면 코를 덜 곤다.
) -->
OSA 는 호흡기 내과에서도 중요하게 보고, 신경과 등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.
) -->
[기면병]
hypocretin(orexin) deficiency 로 생기는데, modafinil 이 orexin도 올려주고, alpha-1, dopamine 도 올려 주고, histamine 도 올려 줌. [정확한 기전은 모름]
-> modafinil 이 탈력발작에 대한 효능은 거의 없음.
) -->
탈력발작(cataplexy) 치료: [1] sodium oxybate [2] GHB 등이 사용된다.
-> GHB(Gamma-hydrobutyrate) : 물뽕이다. rape drug 이다. anterograde amnesia를 일으키는 약이다. 무색/무취라서 술에다가 뽕 타서, 상대방에게 먹이는 약
) -->
) -->
) -->
) -->
RLS 와 PLMD를 구분하는 방법은?
- RLS : 각성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일까? 수면 초반에도 일어날 수 있다. 대부분은 voluntary movement 이다.
- PLMD : involuntary movement 이다. 노인에서 많이 발생
[아직 원인은 잘 모른다.]
-> 밤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.
-> ISDS-2 진단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온다.
) -->
RLS Tx: dopaminergic medication : ropinirole 등
-> iron deficiency 때 잘 발생하므로 빈혈 수치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.
) -->
arousal disorder
-> sleep terror 나 몽유병 등 포함
-> sleep terror : 어린 시절에 갑자기 자다가 무서워 지고 심박수가 매우 빠르게 뛰어 소리를 질렀던 기억. [악몽을 꾼 기억도 안 남]
-> 서파 수면의 비율이 사람에게 짧다. 하루 중에 자면 젊을 때나 나오지, 노년에는 Stage 3,4 까지 안 가는 경우다 많다. SE가 떨어지는 거다. 서파 수면 비율이 높아질수록 SE가 좋고, 다음 날 일어나면 잘 잤다는 느낌을 받는다.
-> alcohol, BDZ 는 SE를 떨어 뜨리고, 서파 수면의 비율을 줄여 버린다.
[그래서 TST는 높아도 SE가 낮아서 불만족 스러운 경우가 많다.]
-> insomnia 환자에서 약 줄이자고 권유를 해야 한다.
) -->
slow wave sleep 도중에 사람을 깨우면, 한동안 이상한 주문 외우고 멍 때리다가 정신이 돌아오기도 한다.
-> 혼돈 각성
) -->
sleep terror: 별로 치료 필요 없다. 주로 benign 하므로 저절로 없어지곤 한다.
-> 안 없어지면 수면의에게 진료 받게 하자.
) -->
몽유병: 수면 도중에 누군가를 죽이고 오거나 하는 건 fiction 이다. [그 사람이 수면을 밥 먹듯이 저질러서, 그렇게 할 수 있으려나??]
) -->
REM 수면 행동 장애: 화나는 꿈 꿀 때 허공에 주먹 휘두르는 경우
※ 모든 이미지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