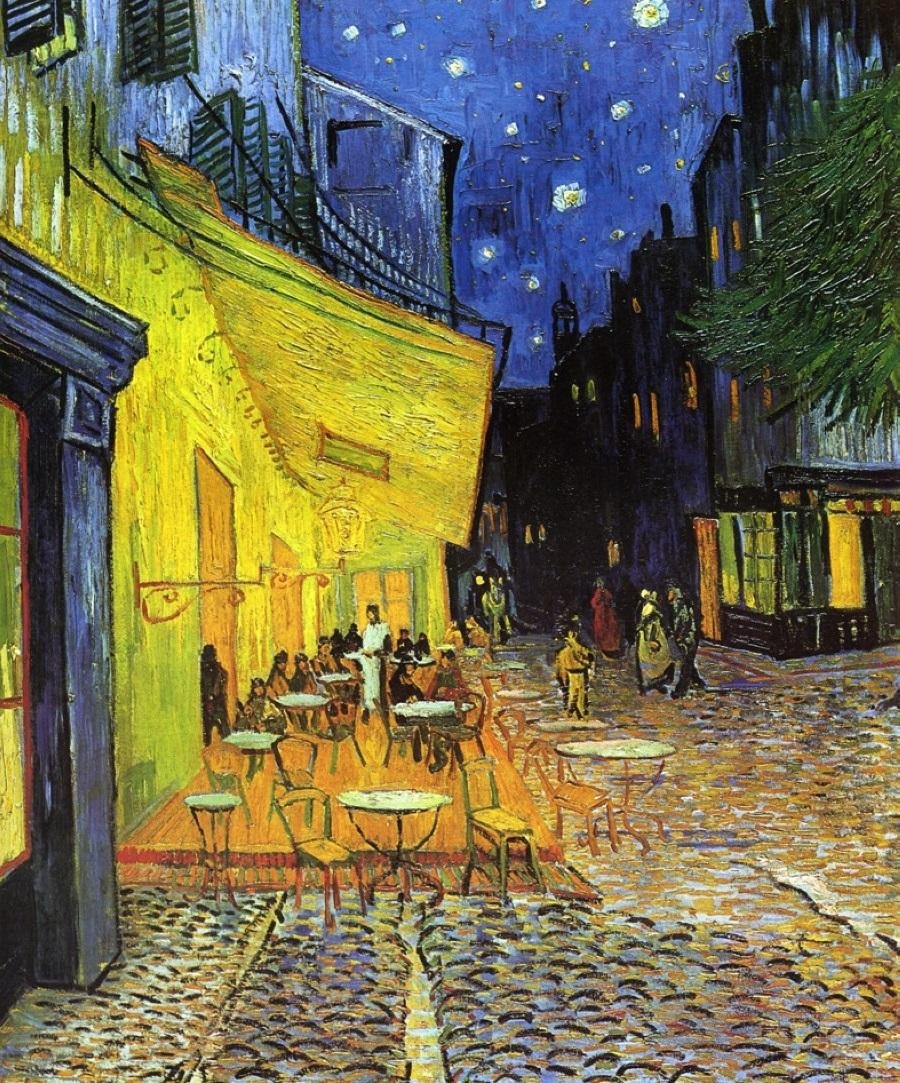임상신경정신약물학 제 2판
) -->
Ch 8. 항우울제
-MAOI에서 조심해야 할 점
: tyramine 함유 음식을 조심해야 함
:급성 고혈압이나 serotonin Sx을 조심해야 함.
) -->
-RIMA 는 통 쓸 일이 없다.
-MAO-I 는 잘 안 쓰게 된다.
-serotonin을 간접적으로 투여하는 건, microglia 연구 어려운 점처럼 광범위하게 작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이 안 되는 점에서 유사하다.
-MAO-I 도 광범위한 inhibition 이다 보니, 요즘은 그냥 serotonin 에 집중해서 밖에서 serotonin을 넣어 주는 식으로 한다. [MAO-I 는 분해하는 출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광범위한 접근법이다]
) -->
Ch 9. 기분 조절제
-lithium 은 우리가 아는 다른 neurotransmitter level 이 아니라, inositol level에서 작용한다.
-inositol 의 고갈을 유발하고, 연쇄반응을 일으킨다.
-glycogen synthase kinase 억제 가설로도 설명이 가능하다.
: 결론적으로 adenylyl cyclase 에 작용을 한다
) -->
[lithium 의 약 역동학]
-혈장 단백질과 거의 결합하지 않고, 대사되지 않는게 특징이다.
-> 간 기능 손상 때도 valproate 보다 더 안전하다. (valproate은 hepatitis 유발한다): 실제 임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다. (AST, ALT 도 많이 올리고)
-lithium 이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, 임상가들이 사용하길 꺼려하는 이유는?
: 신장이나 심장, 갑상선 등에도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, lithium 의 toxicity 가 있어서 그렇다.
-> lithium toxicity 중 가역적인 증상: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초기에는 가역적 후기에는 비가역적, 위장장애,tremor 등은 가역적 , 비가역적인 증상: 신경독성
: tremor 는 lithium 안 주면 사라지고, 위장장애도 약 안 주면 사라짐.
: 비가역적인 부작용이 문제인데 신경독성이 비가역적일 수 있다. 신경독성은 자주 오는 증상은 아닌데 약물 농도가 일시적으로 탈수 등으로 인해 체내에서 올라가 버리면 신경독성이 올 수 있다. (모든 lithium toxicity 가 다 가역적이면 크게 걱정 안 할 것이다.)
-위장장애는 정신과 투약이면 다 있는 거니, 소화제 등과 같이 주면 되니 의사들은 고민 안 하는 부작용이다.
-lithium 의 부작용은 : 신경,신장,심장,갑상선 4가지는 기억해 두기
-> 신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세뇨관 쪽 손상 일으킬 수 있고, 요붕증이 나타나서 요농축 능력이 떨어지기도 한다. interstitial nephritis 도 유발 가능하고, 심하면 fibrosis 나 atrophy 로도 진행 가능하다.
-> 요붕증은 소변을 많이 보는 거다. 오히려, hypernatremia 있거나 하면 도움이 될지도?
-> 신기능 장애는 대부분 가역적이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.
-> 신경 독성이 가장 큰 문제다. 신경 독성이 오기 전에 tremor가 심해 지고 agitation 이 온다. 그 환자가 lithium 먹고 있으면 일단 수액 처치부터 빠르게 drop 시키면서 하고, 응급실에 빨리 가서 hemodialysis를 시켜야 할 수도 있다. lithium 투약은 hold 시키고 말이다.
-> 신경 독성 오기 전에 tremor나 agitation 등 다른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. 아무런 sign 없이 신경 독성이 툭 튀어나오진 않는다. (clozapine에서 seizure 나오듯이 깝툭튀 나오진 않는다.)
-> 임상가가 observation 만 하고 있으면 신경독성을 놓칠 일은 별로 없다.
-> TFT 는 대학 병원에선 routine LAB 이다.
) -->
lithium 복용 시에 여드름양 발진도 있다고 함
(dermatology 쪽으로 걱정하는 약이 아니긴 하다.)
-> mood stabilizer는 dermatological problem 이 다 있는 거다.
-> carbamazepine 과 valproate 은 피부 문제가 자주 관찰된다.
) -->
lithium 은 FDA class D 이다.
-> class D 인 다른 약물들은? BDZ 계열 약, lithium, valporate, carbamazepine
-> BDZ 계열 약이 class D 인 이유는? (모든 BDZ가 다 class D 일까?)
-> lithium 은 Ebstein's anomaly 유발하고, valproate 은 neural tube defect 유발하고, carbamazepine 은 spina bifida 의 기형을 유발한다. [학생 때 기출 문제이기도 함]
) -->
양극성 장애 환자가 임신을 했다면?
-> class D 계열 약은 일단 쓰면 안 된다.
-> class C를 줄 때도 신중하게 줘야 한다.
-> 원치 않으신다면 ECT 등으로 돌려 볼 수도 있다. (그러나 실제로는 ECT도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다)
-> 만약 bipolar disorder 의 manic 환자인데 mood stabilizer를 쓰기 어렵다면? atypical antipsychotics을 써 봐야 한다.
(class C 계열인 atypical antipsychotics을 쓰는 거다.)
-> atypical antipsychotics 은 거의 다 FDA class C 다. [전부 다인가?]
-> class D를 계속 주면 malpractice 이고, 나중에 소송 당해도 할 말이 없다.
-> class C 계열 약을 쓰는데도 환자가 칼 들고, 위험한 짓 하고 증상 호전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보호자, 환자에게 잘 말하고 조심스럽게 class D 쓰는 거다.
(다른 약으로는 sedation 이 안 되는데 lithium 만 쓰면 확 가라앉는 환자들도 있다.)
) -->
대부분은 class C 로 변경을 해도,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ECT 고려하는 거다.(ECT는 임신 시에도 비교적 안전하고, class D 약보단 낫다. 그러나, 실제로 미다졸람 주고 재우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임산부에게 시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.)
-> bipolar- manic 환자 오면 olanzapine 30mg 까지 써서 겨우 살짝 눌러 놓는 경우도 있다. (임산부의 경우)
-> 임산부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다. 협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.
) -->
-lithium 같은 경우에 1.5 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1.5 라는 level 에 맞춰 두면 환자가 조금만 탈수되도 농도가 확 뛴다. 그러므로 평상시 농도는 급성기 환자면 1.0 정도로 유지해 두면 괜찮다. 이 정도면 조금 탈수 되도 1.5 언저리까지 오르지 갑자기 2.0이 되진 않을 것이다.
-> 1.0 인데도 환자가 가라앉지 않으면 atypical antipsychotics을 같이 주거나 valproate을 같이 주면 될 것이다.
) -->
[lithium 의 장점]
-> [1]급성 양극성 우울증에도 치료 효과가 있다.
양극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또 다른 약은? lamotrigine [라믹탈] (과거 이야기, 90년대초반)
요즘은 atypical antipsychotics 이 워낙 잘 나와서 요즘은 이걸 많이 쓴다.
-> [2]간에서 대사가 안 되므로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적다.
-> valproate + risperidone + carbamazepine 까지 쓰면 LFT 도 자주 하고, rash 걱정, CBC 걱정을 늘 하면서 환자를 체크해야 한다.
-> lithium 의 장점은 간을 bypass 한다는 거다.
-> [3] 다른 약에 효과가 없는데 lithium 만 쓰면 neuroleptize 되는 환자들이 있다.
(valproate 은 sedation 되는 느낌이 강한데 lithium 은 느낌이 좀 다르다. neuroleptization 과 sedation 음 엄연히 다르다)
) -->
[antipsychotics 중에 간을 bypass 하는 약]
1. paliperidone 2. amisulpride
) -->
[antidepressants 중에서 간 대사가 적은 약은?(약물학적 상호작용이 적은 약?)]
1. escitalopram 2. mirtazapine 3. desvenlafaxine (Pristiq, venlafaxine 의 대사체)
-> esctialopram 은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을 때 쓰면 되는 아주 잘 만든 약이고, 효과도 좋고, 부작용도 적다.
-> sedation 노려야 하거나, 식욕이 떨어진 환자면 mirtazapine 이 쓰기 좋다.
-> somatic Sx 에는 escitalopram 이 큰 merit가 없어서 venlafaxine, mirtazapine 같은 SNRI 계열 약이나, 아미트립틸린 같은 TCA도 고려 가능하다.
) -->
[carbamazepine]
써 볼 기회가 적다.
-> valproate 의 하위 호환 느낌이다.
-> 약을 썼을 때 느낌은 valproate과 비슷하거나 좀 못한데 부작용은 더 심하다.
-> 약의 세계는 신기해서 valproate에는 효과가 없는데 carbamazepine 에 듣는 환자들이 있긴 하다.
-> 부작용 중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2가지는?
[1] leukopenia [2] hepatotoxicity [3] skin rash
-> valproate 도 rash가 있지만 toxic level 의 rash 는 보기가 어렵다. carbamazepine 쓰면서는 Steven Johnson syndrome 이 의심될 정도로 rash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. lamotrigine 도 toxic 한 피부 질환이 발생 가능하다.
-> 이런 독성 level 의 피부 질환을 겪고 나면 이 약들을 쓰기 두려워 진다.
leukopenia 는 clozapine에서 많이 경험을 해서 상대적으로 익숙하긴 하다.
-> carbamazepine 써서 혈액학적 이상이 온 경우는 흔히 보기 어렵다.
) -->
valproate 과 carbamazepine 의 상호작용은?
-> valproate 는 carbamazepine을 증가시키고, carbamazepine 은 valproate을 낮춘다.
-> valproate 은 acute 환자에선 1200mg 정도 쓰고 carbamazepine 은 900mg 정도 씀
1800, 600으로 외워 버리면 된다.
-> carbamazepine 은 valporate을 낮추니 평소보다 더 높게 1800mg 정도 써야 1200mg~1500mg 정도 용량이 되는 거고 valproate 은 carbamazepine 의 용량을 높이니 carbamazepine 은 평소 쓰던 900mg가 아닌 600mg 정도 써야 한다.
: 이 둘 약을 같이 쓸 일은 통 없긴 하다. 대개 같이 쓰면 lithium 과 같이 쓰긴 함.
) -->
lithium 은 투약 순응도가 무조건 담보 되어야 쓸 수 있다.
-> 투약 순응도가 담보가 안 되면 절대로 주면 안 된다.
-> 정신과 약이 전반적으로 안전해서 DI(Drug intoxication) 으로 죽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lithium 때문에는 죽을 수 있다.
) -->
valproate : GABA 작용 강화 시킴, 부작용이 별로 없진 않지만 SSE(Serious side effect)는 적다.
-> SE(Side effect): 간독성, leukopenia, 탈모 등 (sedation 은 치료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부작용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다. 우울증 약에선 부작용이 되겠지만 말이다.)
탈모: 머리가 잘 빠지곤 한다. zinc, selenium 첨가된 센트룸 같은 비타민 처방을 같이 해 주는 것도 좋다. [이건 비타민 써 보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 싶어진다.]
-> 용량이 너무 세서, 직장 다닐 때 sedation 이 방해가 되거나 하면 valproate을 좀 줄이고, antipsychotics을 살짝 adding 하는 전략도 사용 가능하다.
) -->
SSRI에서 sexual dysfunction 이 심한데, 의사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. Valproate 에선 탈모가 비슷한 느낌의 S/E 다. 환자들의 스트레스는 상당한 부작용이다.
) -->
[Lamotrigine]
-> skin rash 는 조심해야 한다.
-> 25mg 정도부터 start 해서 천천히 올려야 한다. [급하게 올리면 rash 가 생긴다.]
-> 외래에서 보면 rash 여부는 꼭 물어 봐야 함 [“몸통이나 팔, 다리 부근으로 피부에서 새로 생긴 게 있나요?”] -> 봤는데 심하지 않으면 외래 base 면 피부과 한번 가보라고 consult 내 두고, 약을 살짝 감량을 해 볼 수 있다.
-> 약을 부작용 있다고 total change 하면 남아나는 약이 없을 것이다.
) -->
) -->
) -->
[antipsychotics을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?]
-> [1] psychotic features 잡을 때도 쓰고
-> [2] mood stabilizer 는 지금 먹는다고 당장 sedation 되는 게 아니고 2주 정도는 지나야 증상이 좀 잡힌다. 그 기간 동안 atypical antipsychotics을 쓰는 거다. 일단 mood disorder 환자는 나중에는 atypical antipsychotics 는 빼주고, mood stabilizer 도 살짝 줄여주는 게 좋고, 어떤 mood disorder 환자들은 antipsychotics을 빼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.
) -->
quetiapine 도 좋은 약이다 -> valproate처럼 환자를 비몽사몽하게 만든다. XR 제제는 더욱 그렇다. 오자마자 valproate 500+ quetiapine XR 400mg 쓰면 어지럽다고 하면서 비몽사몽할 것이다.
) -->
BDZ를 mood disorder 환자에서 잘 쓰는 경우도 있고, 잘 안 쓰는 경우도 있다.
-> BDZ는 쓰더라도 tapering 계획을 세워서 써라.
-> 퇴원 시킬 때 d/c 시키고 퇴원 시키는 것도 좋다.
※ 모든 이미지는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.
'의학 > 정신약리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정신약리학] 임상신경정신약물학 Ch10. 항불안제 및 수면제 (0) | 2018.11.20 |
|---|---|
| [정신약리학] 신경정신약물학 Ch8. 항우울제 [part 1] (0) | 2018.11.20 |
| [정신약리학] [신경정신약물학 Ch7. 항정신병약물 정리 (0) | 2018.11.18 |
WRITTEN BY
- 케노시스
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.